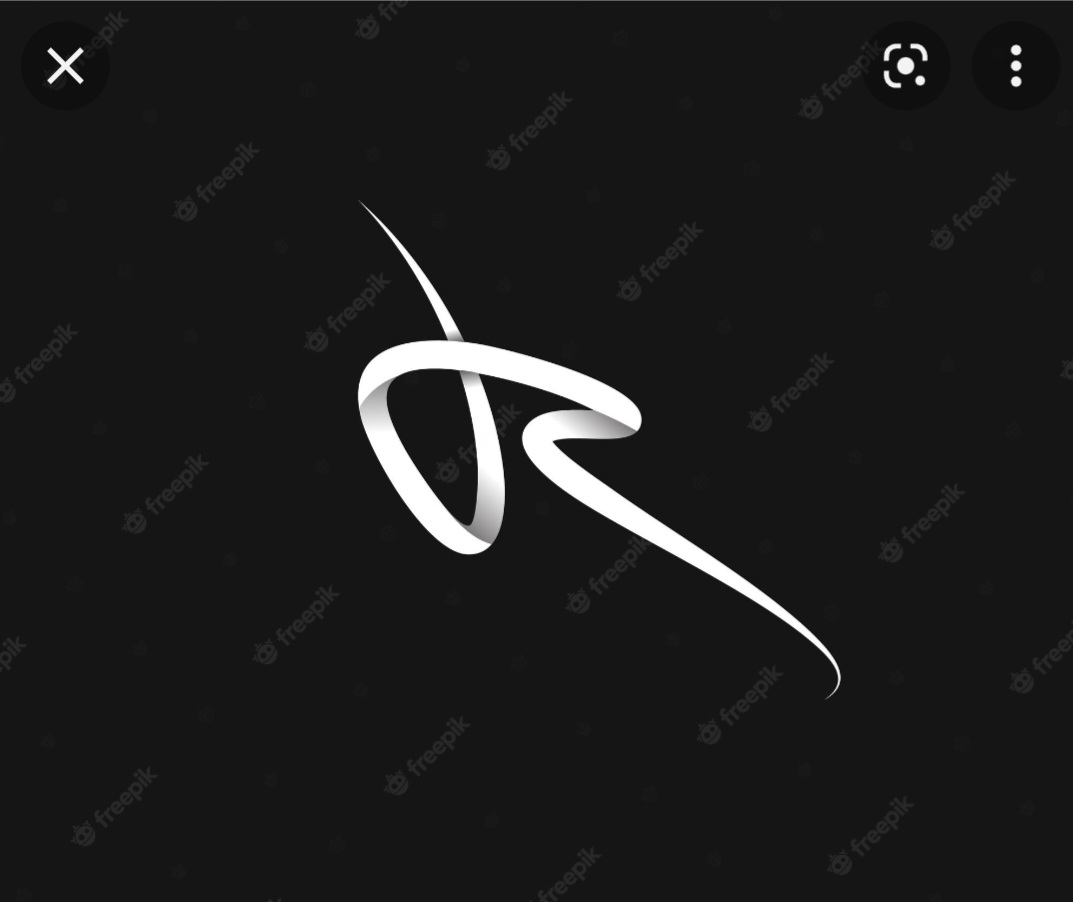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2 | 3 | 4 | 5 | ||
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
| 13 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
| 20 | 21 | 22 | 23 | 24 | 25 | 26 |
| 27 | 28 | 29 | 30 | 31 |
- 다항함수의 미분법
- 실수배의 미분법
- 극한
- 엡실론 n 논법
- 도함수
- 미분형식
- 수열의 극한
- 몫의 미분
- 곱의 미분
- 평균변화율
- 연쇄법칙
- 미적분
- 밀레니엄 난제
- 체인룰
- 4차원 도형
- 모델 베유 군
- 푸앵카레 정리
- 엡실론 델타 논법
- 함수의 극한
- 합차의 미분
- 유율법
- 합성함수의 미분
- 타원곡선
- 미분계수
- 초입방체
- 버츠와 스위너톤 다이어 추측
- 하세 베유 l 함수
- 미분법
- 미분
- 타원곡선 유리수점
- Today
- Total
R수학연구소
[미적분] 11. 연쇄법칙 본문
*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.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*
*모바일에서 수식이 잘리는 경우 밀어보면 더 많은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.*
권장사항: 1. (9편) https://themathematics.tistory.com/18
더욱 복잡한 미분
합차, 곱, 몫의 미분법까지 알면 이제 우리는 모든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심지어는,
같은 함수도, 약간의 계산노가다를 곁들이면 풀 수 있죠.
그럼, 문제 한번 내 보겠습니다.
이 정도야 쉽죠. 전개하면
하지만 이렇게 바꾼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.
이런 함수를 미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'연쇄법칙'입니다.
연쇄법칙은 다항함수의 미분에서 계산노가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.
뿐만 아니라 지수함수나 삼각함수 등 다른 함수에 다항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도 미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.
연쇄법칙
그 강력한 법칙은 어떻게 생겼을까요.
마치 분수끼리 곱할 떄 약분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? 도대체 왜 이런 형태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거고, 저 정체불명의
미분형식
아마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, '수학 II' 교과서를 펼쳐보신 분이라면, 미분계수와 도함수 챕터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"도함수를 f'(x), y',
하지만 저는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설명할 때 f'(x) 와 y'은 언급했지만
그럼 도대체 뭐냐. 저게 바로 미분형식입니다.
미분형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.
이 식,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? 제가 평균변화율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식을 언급한 적 있습니다.
그런데 왜 도대체 저런 길고 귀찮은 표기를 사용하는 걸까요?
기본적으로, 미분이란 연산은 문자가 같을 때만 할수 있습니다.
미분형식을 뜯어보면 '무엇을, 무엇에 대해 미분하는지' 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미분형식의 형태를 보면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에 각각 d가 있고, 그 뒤에 문자가 있습니다. 미분형식은, '분자 쪽 식'을 '분모 쪽 문자'로 미분하는 것입니다. 즉
'그런데 y는 x에 대해 미분할 수 없지 않나요?'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y=? 꼴의 관계식을 대신 미분해주는 겁니다.
미분형식을 이해했으니 연쇄법칙을 다시 써 봅시다.
를 에 대해 미분한 결과는, 를 에 대해 미분한 결과와 를 에 대해 미분한 결과의 곱과 같다.
연쇄법칙의 적용
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저걸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?
사실 연쇄법칙은 '치환'에 관련된 법칙입니다.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?
연쇄법칙은, y를 x에 대해 미분할 때
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, 연쇄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'합성함수의 미분'을 살펴봅시다.
바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연쇄법칙입니다. 연쇄법칙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.
일때,
연쇄법칙의 증명
내친김에 증명까지 해 봅시다.
우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합성함수를 미분할 겁니다. 역시나
우리가 연쇄법칙을 통해 구한 것과 같은 결과 나왔습니다. 즉 도함수의 정의와 연쇄법칙으로 각각 구한 결과값이 같으므로, 연쇄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연쇄법칙은 정말, 정말로 중요한 법칙입니다. 고급 미분에 자주 쓰이거든요.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.
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, 위의 예제
합성함수의 미분법도 매우 자주 쓰일 예정이니 그 형태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 바깥쪽을 미분하고, 알맹이를 미분한 것을 곱한 형태입니다.
다음 글에서는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'미적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미적분] 10. 합차, 곱, 몫의 미분법 (1) | 2022.08.15 |
|---|---|
| [미적분] 9. 다항함수의 미분법 (0) | 2022.03.06 |
| [미적분] 8. 미분계수와 도함수 (0) | 2022.02.24 |
| [미적분] 7. 유율법 (0) | 2022.02.16 |
| [미적분] 6. 평균변화율 (0) | 2022.02.13 |